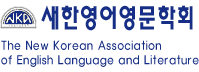노벨문학상 수상작 ‘남아있는 나날’은 오역된 제목
일본태생 영국작가 가즈오 이시구로 대표소설
‘그날의 흔적’ 또는 ‘그날의 자취’ 정도가 타당한 번역
일본어제목: ‘日の名殘り’(그날의 잔영)
중국어제목: ‘長日留痕’(그날의 버려진 흔적)
독일어제목: Was vom Tage ubrigblieb(그날의 遺物)
불어제목: Les Vestiges du jour(그날의 흔적)
전세계 40개국 언어로 출간된 제목 모두 같아
국내 출판사-신문방송-인터넷 온통 오역도배
017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태생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 일본명: カズオ?イシグロ, 石?一雄)의 대표작 ‘The Remains of the day’는 국내 한국어 출판서적은 물론 신문방송과 인터넷에‘남아있는 나날’로 번역돼 있으나 이는 오역된 제목이다. 그날의 흔적’ 또는‘그날의 잔영 ’, ‘그날의 기억’,‘그날의 유물(遺物)’ 정도로 번역해야 옳을 것이다.
이 소설은 40개국 언어로 출판됐는 데 그 제목이 모두 ‘그날의 남은 것(What is Left of the Day)’이란 의미로 번역됐다. 예컨대 일본어 제목은 ‘日の名殘り’(그날의 잔영), 중국어 제목은 ‘長日留痕’(장일유흔: 그날의 버려진 흔적)이다. 프랑스어 제목은 Les Vestiges du jour(그날의 흔적), 독일어 제목은 Was vom Tage ubrigblieb(그날의 遺物), 스페인어 제목은 Lo que queda del dia(그날의 遺跡)이다. 전 세계 독자들이 ‘그날의 흔적’이란 의미로 알고있는 데 유독 한국 독자들만 ‘남아있는 나날’로 알고 있다면 이는 ‘사실왜곡’도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출판사측은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 제목을 정했다고 하지만 국내에선 제목이 오역으로 드러나 재출판된 소설이 적지않다. 예컨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은 제목이 폭풍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역이라 ‘워더링 화이츠’(Wuthering Heights)로, 에드워드 포스터의 ‘하워드家의 종말’ 은 제목이 주인공의 시골집 주소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하워즈 엔드’(Howards End)로 수정됐다.
번역서의 제목이 반드시 원전과 같을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도 작품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그래서 일찍이 영국의 작가이자 역사가이며 법관인 우드하우즐리(Woodhouselee)는 “최상의 번역가란 동종(同種)의 원전을 만들어내는 작가다(The best translators have been those writers who have composed original works of the same species.)라고 말했다.
가즈오의 이 소설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 부커상(Man Booker) 수상작이기도하다.
제임스 아이보리(James Ivory)감독, 안소니 홉킨스 - 엠마 톰슨 주연의 1993년 영미합작 영화 ‘The Remains of the day’ 역시 가즈오의 1989년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영화 제목 역시 ‘남아있는 나날’로 오역돼 있다. 이 영화는 가장 최근인 2013년 12월 7일 저녁 11시에 방영된 EBS의 ‘세계의 명화’에서도 ‘남아 있는 나날’이란 오역된 제목으로 소개됐다. 당시 EBS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국내 신문들은 연쇄적으로 오역을 하고 말았다.
‘remain’은 명사로 쓰일 때 통상 복수형(remains)을 취하며 흔적, 잔존물, 잔해, 궤적, 자취, 유물, 유적, 잔액, 유체(遺體) 유고(遺稿), 유족(遺族) 등의 뜻이 있다.
가즈오의 이 작품은 브론테 자매나 제인 오스틴의 작품처럼 오리지널 영국문학의 분위기를 아주 강하게 풍긴다. 작품의 큰 줄거리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못하고 아버지의 임종도 지켜보지못한채 자신을 희생해가며 주인을 위해 충성으로 평생을 바친 한 남자가 인생의 황혼에서 바라보는 지나온 삶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만큼 ‘남아있는 나날’이란 작품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제목이다.
이 책은 처음 민음사에서 ‘남아 있는 나날’이란 이름으로 출간된 탓인지 영화 제목도 같은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적', '신아사'역도 모두 제목이 ‘남아있는 나날’로 돼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사전, 위키백과, 언론 보도기사 등 온통 오역된 제목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이같은 책 제목 때문인지 서평에는 “젊은 나날의 사랑은 지나갔지만, 남아 있는 나날에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원작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표현도 들어가 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실린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 이를 보면 ‘그날의 흔적’인지 ‘남아있는 나날’인지 쉽게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1958년, 스티븐스(Stevens: 안소니 홉킨스 분)는 영국 시골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 중 그는 1930년대 국제회의 장소로 유명했던 달링턴 홀(Darlington Hall), 그리고 주인 달링턴 경(Lord Darlington, 제임스 폭스 분)을 위해 시골 저택 집사로 일해 왔던 지난날을 회고해본다. 당시 유럽은 나치즘의 태동과 함께 전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스티븐스는 달링턴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독일과의 화합을 추진하던 달링턴은 친 나치주의자로 몰려 종전 후 폐인이 되고 만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맹목적인 충직스러움과 직업의식 때문에 사생활의 많은 부분이 희생되었음을 깨닫는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고, 매력적인 켄튼(Miss Kenton, 엠마 톰슨 분)의 사랑을 일부러 무시했고 몇 년 동안 켄튼과의 관계는 경직되어왔다.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애모의 정을 감춘 채 스티븐스는 오로지 임무에만 충실해온 것이다. 결국 그의 태도에 실망한 켄튼은 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야 만다. 지금 스티븐스는 결혼에 실패한 켄튼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녀를 설득시켜 지난날 감정을 바로잡아 잃어버린 젊은 날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그러나 이러한 희망마저 무산되고 그는 새 주인에 의해 다시 옛 모습을 되찾게 된 달링턴 저택으로 혼자 외로이 돌아온다. 지난날의 온갖 영욕을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남은 달링턴 마을은 어쩌면 자신과 조국 영국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Internet Movie Database: IMDB)나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의 보도를 보더라도 가즈오의 ‘The remains of the day’는 주인공 스티븐스가 주인에 충성하며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까지 포기했던 지나간 특정시점(particular point)에서의 자신의 생애를 회상(reflection)하고 기억(memory)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오역된 제목처럼 ‘남아있는 날에도 희망은 있다’는 식으로 미래나 여생(餘生)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즈오의 작품으로는 이밖에도 장편소설 창백한 언덕 풍경(A Pale View of Hills, 1982),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The Unconsoled, 1995), 우리가 고아였을 때(When We Were Orphans, 2000),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 2005), 파묻힌 거인(The Buried Giant, 2015), 단편소설 녹턴: 음악과 황혼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Nocturnes: Five Stories of Music and Nightfall, 2009)등이 있다.
<참고> 서옥식: <오역의 제국-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2013, 도서출판 도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