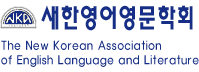김영란법 핵심‘더치 페이’는 세계 영어사전에 없는 콩글리시
Dutch pay는 Dutch treat 또는 go(ing) Dutch로 써야 옳다
'나눠 내기‘‘각자 내기’‘각자 계산’ 등으로 쓰는 것이 좋아
‘더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네덜란드인 감정 생각해서도 사용신중해야
파이팅, 원샷, 핸드폰, 클로징멘트 등은 대표적인 오용 영어
웰빙 푸드, 모닝콜, 프림, 개그 콘서트, 스킨십, 바바리맨도 엉터리
방송국의 드라마 연출가를 의미하는 약어‘PD’도 사전에 없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있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전국 판사들에게 “변호사와는 어떤 경우에도 식사비를 ‘더치페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을 보도하는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도 ‘더치페이’라는 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려 식사 등을 할때 ‘각자 내기’(국립국어원 표기) ‘나눠 내기’, ‘각자 계산’, ‘각자 부담’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더치페이’(Dutch pay)라는 말은 영어사전에도 없는 완전한 콩글리시(Konglish=Korean English)다.
바른 표현은 Dutch treat, go(going) Dutch이다. 이에 따라 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회식(또는 오락회)은 ‘Dutch treat party’라하며 비용을 분담하자고 말할 때는 ‘Let‘s go dutch.’라고 한다. ‘Dutch lunch(supper)’라는 말도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점심(저녁)을 뜻한다. 참고로 음식값을 나눠 내자고 할 때는 Let‘s split the bill’, ‘반반씩 부담하자’고 말할때는 ‘Let‘s go fifty-fifty’ 또는 ‘Let‘s go half and half’ 등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Dutch’란 영국이 과거 식민지 쟁탈시기 경쟁자였던 네덜란드인(Dutchman)를 지칭할 때 쓰던 경멸조의 말이다. 네덜란드는 1602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식민지 경영과 무역확장을 위해 동인도회사를 세우고 영국과 식민지를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3차례에 걸친 영-화란전쟁을 계기로 제해권(制海權)이 점차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양국간 갈등이 첨예화 됐고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사사건건 영국인들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영국인들은 이런 네덜란드인들을 탓하면서 ‘Dutch’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네덜란드인들이 ‘가짜’(false) 또는 ‘형편없다’(lousy)라는 것이었다. 이 ‘Dutch’에 ‘대접하다’, ‘한턱 내다’는 뜻의 ‘treat’가 결합된 말이 ‘Dutch treat’인데 그 뜻은 <대접이긴 하지만 알고보니 자기 먹은 것은 자기가 값을 치러야하는 대접아닌 대접>이 돼버렸다.
오늘날에도 ‘Dutch’라는 단어는 명사로 ‘네덜란드인’, ‘네덜란드어’를 가리킬때, 그리고 형용사로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말의’, ‘네덜란드사람의’, ‘네덜란드식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공식 국가명칭을 ‘The Netherlands’로 불러 달라고 세계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칭하는 또다른 이름으로 ‘숲의 나라’(wood land)라는 의미를 지닌 ‘Holland’가 있으나 이는 네덜란드에 산재한 여러 지역 중의 일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이 아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 하지않고 경인지역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이러한 ‘Dutch’라는 단어는 오늘날 일부에서 네덜란드인들을 찰스 디킨슨의 소설 크리스머스 캐롤(A Christmas Carol)에 나오는 스크루지(Scrooge)같은 ‘수전노’ 또는 ‘인색한 사람들’(stingy people)로 비하하는 뜻으로 까지 사용되고 있다.
실제 ‘Dutch’가 들어가는 부정적인 의미의 여러 단어가 생겼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Dutch gold(metal)’(구리에 아연을 섞어 만든 가짜 금), ‘Dutch barn’(헛간(외양간)이지만 건초더미위에 세운 볼품없는 지붕과 기둥밖에 없는 헛간), ‘Dutch bargain’(술좌석에서 하는 계약: 뒷날 술취해 서명했다며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함), ‘Dutch courage’(술취한 사람이 부리는 만용), ‘Dutch feast’(주인이 손님보다 먼저 취해서 난장판이 된 잔치), ‘Dutch uncle’(잔소리꾼 또는 엄하게 꾸짓는 사람), ‘Dutch wife’(홀아비가 품고자는 긴 베개 즉, 죽부인), ‘Dutch widow’(성매매 여성), ‘double Dutch’(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 ‘Dutch comfort’(이 이상 더 나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위안), ‘Dutch concert’(각자 다른 노래를 동시에 불러 소음을 야기하는 네덜란드식 혼성합창) 등이다. 한편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 ‘Flying Dutchman’이 나오는 데 이는 19세기 전설속에 아프리카 희망봉 주변에서 출몰한다는 유령선(의 선장)을 일컫는다.
실제 ‘Dutch pay’라는 단어는 옥스퍼드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이나 케임브리지영어사전(Cambridge Advanced Learmner' Dictionary), 메리엄-웹스터 영어사전(Merriam-Webster Dictionary), 롱맨영어사전(LONGMAN Dictionary), 콜린즈 코빌드 영어사전(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등 세계적으로 정평있고 권위있는 영영사전은 물론 약 4백만 단어에 달하는 은어, 속어, 인터넷 유행어 등을 수록하고 있는 온라인 영영사전 어번 딕셔너리(www. urbandictionary.com)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Dutch pay’는 한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영한사전인 에센스 영한사전과 온라인 네이버(Naver)영어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다. 다만 네이버 영어사전은 ‘Dutch pay’가 콩글리시이며 바른 영어 표현은 ‘Dutch treat’, ‘go Dutch’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Daum)’ 영어사전에는 소문자로 ‘dutch pay’라고 쓴 뒤 ‘자기 몫을 각자 내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국적 불명의 단어가 ‘다음’사전에만 올라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 세계에 통용되지 않고 사전에도 올라있지도 않은 ‘더치페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네덜란드 국민에게 한국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밖에 국내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주요 영어단어 또는 영어표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역으로 잘못 시용되고 있는 말들도 소개한다.
▲파이팅, 원샷, 핸드폰 등은 대표적인 오용 영어
영어의 오역, 오용 등 엉터리 영어를 가장 많이 부추기는(?) 곳이 있다면 아마 방송 연예프로그램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하루도 연예인 등 출연자들의 입에서 엉터리 영어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이는 시청자들이 연예인들의 입을 통해 엉터리 영어를 자주 듣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출연자들의 입을 통해 방송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엉터리 영어나 오용되고 있는 영어 단어는 ‘파이팅’(fighting), ‘원샷’(one shot), ‘핸드폰’(hand phone)등 일 것이다. 영어의 fighting에는 ‘힘을 내자’, ‘힘내라’ 등의 의미가 없다. 전 세계 어느 모임이나 경기장에서 fighting을 외치는 사람은 한국인이나 한국선수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fighting을 외칠 때 처음 무슨 영문인지 모른다고 한다. 때로는 한국인들을 호전적인 국민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방송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fighting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fighting은 Go!, Go Go!, Go for it!, Way to go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 예컨대 ‘홍길동 파이팅!’ 대신 ‘Go, Gil-Dong, Go!’, ‘Way to go, Gil-Dong’이라고 해야 한다.
※ ‘shot’의 다양한 의미
shot에는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shot gun: 엽총(獵銃)
-shot put: 포환던지기
-pay one's shot: 자신 몫을 내다.
-cheap shot: 비열한 플레이나 언동
-cheap-shot artist: 비열한 언동을 하는 자, 약자를 괴롭히는자
-cross shot 크로스 숏: 화면에 대해서 비스듬히 찍은 화상, 코트의 대각선으로 치는 공
-dead shot: 사격의 명수
-dunk shot: 높이 점프해서 메어꽂듯이 하는 슛
-follow shot: 밀어치기, (피사체에 맞춘) 이동 촬영
-foul shot: 상대방의 반칙에 의해 주어지는 free throw
-big shot: 거물, hotshot: 유능한 사람
-mug shot: 얼굴 사진
-parting shot: 마지막 화살, 떠나면서 내뱉는 가시돋힌 말(=Parthian shot)
-Bull Shot: (칵테일용어) 칵테일 불 샷
-shoot the breeze: 한담을 나누다, 수다를 떨다
-shoot the bull: 헛소리를 지껄이다, 허풍 떨다
-bacterial shot hole: 복숭아나무세균성구멍병
-Today was winter's last shot.: 오늘 꽃샘 추위가 있었다.
-He shot a suspicious glance at me: 그는 내게 의심에 찬 눈초리를 던졌다
-It's a shot in the dark: 실수로 어쩌다가 맞았어
-shot his bolt: 하는 일마다 잡치다
-There's nothing to lose. Why don't you give it a shot?: 밑져야 본전이에요. 한번 해 보세요
원샷(one shot)에는 ‘한 번에 쭉 들이키다’라는 의미가 없다. 오역이다. 그런데도 이 단어는 맥주 등 술 광고를 통해 그런 뜻으로 거침없이 TV에 나온다. TV연속극에서도 우정을 다지는 회식장면 등에 자주 등장한다. Bottoms up이나 Slam it, Chug-a-lug!(간단히 줄여 Chug)등으로 해야 옳다.
one shot은 ‘한번에 들이켜 마시기’라는 뜻은 없고 ‘주사한방’, 골프에서의 ‘1타’, ‘총알 한발’, ‘술 한잔’(a shot of whiskey)등의 의미로 쓰인다. 원 샷이 총알 한발이란 뜻은 미국 서부개척 시대, 거칠은 황야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쓴 총잡이들이 태번 등 술집에서 총알 하나를 내밀면서 ‘원 샷!’하면 술집 주인이 술을 한 잔 줬다는 데서 유래했다. 돈이 없어 총알을 술값으로 대신 지불한 것이다.
전쟁 게임 비디오 ‘Call of Duty 4: Modern Warfare’(콜 오브 듀티 4: 현대전)의 제2막에 ‘One shot one kill’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사격시 총알 한방으로 적 1명을 반드시 죽인다는 즉, 일발필중 또는 명중, 정밀사격(a precision shooting)을 의미한다. 러브샷(love shot) 이라는 것은 옥스퍼드영어사전에도 없는 콩클리시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twine arms’(팔을 꼰) 또는 ‘arms entwined’(팔짱을 낀) 정도가 되겠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런 음주습관은 거의 없다.
또한 사진이나 영화 등의 한차례 촬영이나 스냅, 한 화면(a close shot: 근접 촬영, a long shot 원거리 촬영), 1회로 끝나는 간행물(소설, 기사, 프로그램 등), 1회로 끝나는 상연 또는 배우의 출연, 1회로 끝나는 거래 또는 경기, 1회로 끝나는 매출(sale), 배당액(몫), 1회로 끝나는 치료(cure), 딱 한 번의 섹스만 허용하는 여성 등의 의미를 가진다.
‘hand phone’도 사전에 없는 엉터리 영어다. cellular phone, mobile phone등으로 고쳐 써야하는 데도 방송 드라마의 대화 장면 등에서 자주 등장한다. 명함에도 hand phone으로 적고 줄여서 H.P.(또는 h.p.)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H.P.(h.p.)는 horsepower(마력), hire purchase(할부구입), hot-press(가열압착기), high pressure(고압, 고기압)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렇다고 mobile phone, cellular phone을 각각 M.P.(또는 m.p.), C.P.(또는 c.p.)등으로 표기하는 것도 엉터리다. 휴대 전화와는 달리 지상 통신선으로 연결되는 일반 전화는 landline phone이라고 한다. 집전화(home phone, private phone)나 회사전화(company phone, business phone)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중전화는 pay phone, public (tele)phone 등으로 부른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전화기 등 송수화기에 전화선이 없는 전화기는 cordless phone(무선전화)이라고 부른다.
▲ 웰빙 푸드, 모닝콜, 프림, 개그 콘서트, 스킨십 도 엉터리
웰빙 푸드(well-being food)는 ‘healthful food’, 커피에 타서먹는 프림(Prim)은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cream’으로 고쳐 써야한다. 잠자는 사람을 아침에 전화로 깨운다는 뜻으로 쓰이는 모닝 콜(morning call)은 ‘wake up call’로 바꿔 써야 한다. 물론 영어 사전에 ‘morning call’이란 것이 나오지만 이는 (사교 목적의) 아침 방문을 뜻하는 말이다.
모닝 커피(morning coffee), 개그 콘서트(gag concert), 골든 타임(golden time), TV 탤런트(TV talent), 커트라인(cutline), 네임 밸류(name value), 스킨십(skinship), 노이즈 마케팅(noize marketing)등은 영어사전에 없는 엉터리 영어다. ‘membership training’의 뜻으로 쓰이는 조어 MT나 행복을 퍼트리는 사람이란 의미로 한국에서 쓰이는 ‘happy virus’도 영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요즘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언론에 ‘바바리맨’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으나 영어에 ‘바바리맨’(Burberry man)이란 단어는 없다. 노출광이란 뜻의 ‘flasher’를 써야 한다.
방송에서 영어 단어의 뜻을 처음부터 잘못 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세계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agriculture+inflation)이라고 하는 데 이를 에그플레이션(eggflation, 달걀인플레이션)으로 잘못 말하는가 하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을 뜻하는 sexism(섹시즘)이 ‘성적매력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grand open이나 bargain sale, after service 등도 엉터리 영어이긴 마찬 가지. 각각 grand opening, sale, after-sales service(수리 서비스라면 repair service, 보증과 관련되면 warranty)로 써야 한다.
▲ ‘무비 마니아’, ‘클로징 멘트’ 등도 가짜 영어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편집(偏執)할 때 ‘mania’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mania는 난폭하거나 격렬한 정신장애, 광기 등 정신의학상의 질병을 의미(부정적)하며 열애가, 애호가 등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때는 buff, bug같은 단어를 사용해 예컨대 ‘영화광’일 경우 movie buff, film buff 등으로 표현해야한다. 설사 질병에 가까운 영화광일 경우라도 movie mania가 아니라 movie maniac으로 해야한다. 정신상태를 말할 때는 mania, 사람을 나타낼 때는 maniac을 쓴다.
‘-ment’의 경우도 마찬가지. -ment는 ‘statement’ 나 ‘comment’같은 단어의 꼬리에 붙는 접미사로서 혼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방송에서 진행자가 도입부분에서 한마디 하는 것을 흔히 ‘opening ment’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엉터리 영어이다. monologue라고 해야한다. ‘closing ment’는 closing comment로 해야한다.
▲‘솔로’를 ‘독신’의 의미로 쓰는 황당한 방송프로와 노래
‘솔로’(solo)는 독주나 독창 등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도 solo라는 말은 한국에서 엉뚱하게도 ‘독신’의 뜻으로 쓰인다. 최근에는 ‘솔로대첩’이란 것도 생겼다. 독신들을 위한 대규모 즉석 만남 이벤트이다. 참가 방법은 크리스머스 이브 같은 날 남자는 흰색, 여자는 붉은색 옷을 입고 길거리 지정 지역에 모여 남녀가 양편에서 대기하다 진행자의 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이성을 향해 달려가 손을 잡으면 끝나는 행사다.
한국을 찾은 영어권 외국인들은 TV서 흘러나오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댄다고 한다. “저 가수가 밴드(그룹)로 나와서 왜 자꾸 ‘솔로’라고 하느냐”고 묻는다. 신예 아이돌 그룹 씨클라운의 ‘솔로(Solo)’ 무대를 본 반응이다. 씨클라운의 이 노래는 실연의 아픔과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노랫말에는 ‘아임 솔로, 메이비 아임 솔로’(I’m solo. Maybe I’m solo.)’의 반복구가 자주 등장한다. 독신이 됐다는 의미라면 ‘아임 싱글’(I’m single.)로 해야 바른 영어 표현이다.
한 TV 방송은 2013년 2월 16일 1인 가족이 늘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수십회나 ‘솔로족’, ‘싱글족’이란 표현을 거침없이 썼다.
▲방송국의 드라마 연출가를 의미하는 약어‘PD’는 사전에 없는 말
국내에서는 production director 또는 producer의 약어로 ‘PD’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고 있으나 ‘PD’는 사전에 없는 단어이고 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production은 ‘생산’ ‘제작’, producer는 ‘생산자’ ‘제작자’를 뜻하기 때문에 ‘director’(감독, 연출가)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movie producer는 영화제작자, movie director는 영화감독으로 불린다. 무대감독을 뜻하는 용어로 floor director라는 것도 있다. 이런 점에서 MBC의 PD수첩이나 언론에서 자주 쓰는 PD저널리즘이란 말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예컨대 “그는 MBC의 유명한 PD이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He is a famous director in MBC.”라고 한다.
▲여성의 멋진 몸매를 가리키는‘S-line’은 엉터리 영어
멋지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성을 가리켜 방송 연예프로그램에서 흔히 S-line이라고 하는 데 이는 완전한 엉터리 영어다. 이런 여성을 말할 때는 굴곡 또는 곡선미를 나타내는 curves나 형용사형인 curvy, curvaceous등을 사용해 She's got great curves., She is very curvy., She has a curvy body., She is very curvaceous.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밖에 S자를 닮은 모래시계(hourglass)에 빗대어 She's got an hourglass shape.라고 할 수 있다.
▲기타 배꼽을 잡을 황당한 오역 사례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eneral Motors(제너럴 모터스)를 ‘모터스 장군’, 아군의 오발 등에 의한 포화(砲火)를 뜻하는 friendly fire를 ‘친근한 포화’(아군 사이의 오인 사격을 뜻하는 숙어에는 ‘blue-on-blue’라는 것도 있다), 활성산소를 말하는 free radical을 ‘자유급진당원’,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처럼 대치중인 두 적대 병력간의 중간지대나 여군막사를 뜻하는 no man's land를 ‘무인지대’, 나포선박환매증서인 ransom bill을 (인질 등의) ‘몸값 청구서’, 사복경찰관인 plain-clothes man을 ‘평복을 입은 사람’, 불만 사항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찾는 간담회라는 뜻의 beef session을 ‘쇠고기 먹는 파티’, 허황한 이야기란 뜻의 ‘tall tales’를 ‘긴 이야기’, 명문귀족집안 또는 양반혈통이란 뜻의 ‘blue blood’를 ‘죽은 피’, 미국의 총기규제법 대상인 대용량 ‘탄창’(magazines)을 ‘잡지’로 오역한 경우 등이다.
할리우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를 ‘만국의 작업장’, 아카데미상(Academy Award)을 ‘학교 상장’, 판권소유(저작권 보유)를 표시하는 All rights reserved를 ‘모두 오른쪽으로 예약함’, 모세의 형상(Mosaic image)을 ‘모자이크 상’, 선셋 대로(Sunset Boulevard)를 ‘석양의 거리’로 번역하기도 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Sunset Boulevard는 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서쪽에 있는 거리 이름이다. Sunset Boulevard란 제목의 영화도 있다. 윌리엄 홀던(William Holden)과 글로리아 스완슨(Gloria Swanson)이 주연으로 나오는 빌리 와일더 감독의 이 미국 영화는 1950년 작품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미쳐버린 한 무성영화 여배우를 그린 흑백영화이다. 국내에서는 1956년 개봉됐다.
1994-1995년 미국에서 인기절찬리에 방영된 TV 코미디 시리즈물 ‘Moving story’(감동적인 이야기)가 ‘움직이는 이야기’로 번역돼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찰스 디킨스의 장편소설로 1998년 영화화된 ‘Great Expectations’(막대한 유산)는 ‘위대한 유산’으로 오역돼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 특히 대학생들이 필독해야할 도서 100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권장도서 해제집’(2006)도 ‘위대한 유산’으로 오역돼 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는 노동조합을 뜻하는 ‘trade union’을 ‘무역협회’로 번역했는가 하면 마샬 버만(Mashall Berman)의 ‘현대성의 경험’(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에서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one-dimentional man’은 ‘1차원적 인간’이 아닌 ‘평면적 인간’으로, 제럴드 그라프(Gerald Graff)의 ‘문학에 대항하는 문학’(Literature against itself)’은 ‘자신이 적이 되어가는 문학’으로 오역됐다.
‘tax heaven’은 ‘조세 피난처’ 또는 ‘조세회피지역’ 인 데도 문자 그대로 직역하여 ‘세금 천국’ 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tax heaven’은 ‘tax haven’에서 유래한 것으로 ‘tax’와 항구, 피난처, 안식처를 뜻하는 ‘haven’의 합성어이다. ‘tax break’는 ‘감세’를 말하는데 국내 방송에서는 ‘탈세’로 오역한 적이 있다.
빅 매치(big match)를 ‘커다란 성냥’, 와일드 빌(Wild Bill)을 ‘야생 영수증’, heart attack을 ‘심장공격’, heart failure를 ‘심장실패’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될까? 와일드 빌은 남북전쟁 때 북군의 척후병으로 활동했던 미국 서부의 전설적인 총잡이 Wild Bill Hickok(1837-1876)을 말한다. heart attack과 heart failure는 모두 심장마비를 가리킨다. 이에 반해 heartbreak는 ‘심장파괴’가 아니라 비통, 비탄, 실연때의 애끓는 마음 등을 뜻한다. 안동 도산서원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외국관광객들에게 퇴계선생의 학문분야를 설명하면서 성리학(性理學)을 ‘theory about sex’라고 번역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신문 기사에서 gunship을 ‘포함’(砲艦), warship을 ‘전함’(戰艦)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공격용 헬기’, ‘군함’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gunship이란 베트남 전쟁 때 헬기가 마치 푸른 바다 같은 정글 위를 누비며 공격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전함은 battleship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類)의 함정은 이미 퇴역하고 없다. rebel도 ‘反軍’이 아니라 ‘叛軍’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전쟁무기인 tank(탱크)를 ‘전차’(戰車)로 옮기다보니 fuel tank(연료탱크)를 ‘연료전차’, 그리고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 안에 작은 인형이나 장식을 넣은 소품을 말하는 스노 글로브(snow globe)를 ‘장갑’으로 오역하기도 한다. atom bomb-free zone 혹은 nuclear-free zone은 ‘비핵지대’(사실은 무핵지대가 바른 표현)인데 이를 ‘원폭 자유지대’, ‘핵자유지대’로 번역하면 정반대의 뜻이 돼버린다. 예컨대 과거 미국과 소련이 인도양을 nuclear-free zone으로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를 ‘핵자유지대’로 번역하게되면 독자들은 엉뚱하게도 핵무기의 운반, 발사 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지역쯤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knock down from the downtown은 시내 중심가로부터 녹다운 되다는 뜻이 아니라 ‘(농구에서) 3점 슛을 얻어맞다’, affirmative action은 긍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소수 집단 우대정책’, amphibious operation은 수륙양용작전이 아니라 ‘상륙작전’, at the eleventh hour는 ‘11시’ 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막바지 순간)’을, southpaw는 ‘남쪽발톱’이 아니라 ‘왼손잡이’, fish story는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된(터무니없는) 이야기’나 ‘허풍’을 말한다. lemon law는 레몬법이 아니라 미국의 ‘결함차(車) 보상법’(예컨대 ‘His car is a lemon.’이라고 하면 ‘그의 차는 고물이야.’라는 뜻이다), kangaroo care는 캥거루 보호가 아니라 ‘신생아 보호’, fun run은 재미있는 달리기가 아니라 ‘자선 달리기’(아마추어 육상선수들이 기금모금을 위해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를 뜻한다. birthday suit는 수영장 같은 곳에서 수영복(swimming suit)을 입는 대신 완전히 옷을 벗고 뛰어들 때 사용하는 말, 즉 ‘알몸’이라는 뜻인데 ‘생일에 입는 복장’으로 오역되고 있다. a fly in the ointment는 ‘연고위의 파리’가 아니라 ‘옥에 티’라는 뜻이다. firefight는 포격전 또는 육박전에 대응하는 총격전을 뜻하는 데 ‘소방’(消防)으로 잘못 번역되고 있다. 소방의 의미가 되려면 ‘fire fighting’으로 표기돼야 한다. the kill box는 전쟁에서의 ‘화력격멸구역’인데도 ‘죽음의 상자’로 번역됐다. sleeve fish는 소매 물고기가 아니라 ‘오징어’(squid)를 말하며 coffee and cake(s)는 커피와 케이크라는 가장 값싼 식사라는 의미에서 출발해 오늘날은 ‘싸구려 월급 또는 푼돈’을 말한다. 따라서 싸구려 급료(저임금)를 받는 직업은 coffee-and-cake-job이라고 한다. kiss-me-quick은 ‘팬지’, forget-me-not은 ‘물망초’, touch-me-not은 ‘봉선화류의 꽃’을 가리킨다. hot sellers는 뜨거운 상품이 아니라 ‘인기상품’, soup kitchen은 수프를 만드는 부엌이 아니라 ‘무료급식소’를 뜻한다. animal spirit는 동물정신이 아니라 ‘야성적 충동’이란 뜻이다.
bury the hatchet은 ‘서로 싸움이나 논쟁을 중단한다’는 뜻인데 ‘도끼를 파묻다’, as the crow flies는 ‘최단(직선) 거리’로 라는 의미인데 ‘까마귀 날아가는 거리로’로 오역돼있다. ‘당분간’이란 의미의 ‘for the time being’을 철학적 의미를 부여해 ‘시간의 존재를 위하여’로 오역한 학자도 있다. 속담 “Our last garment is made without pockets”의 뜻은 “우리들의 마지막 의상은 주머니 없이 만들어 진다”가 아니라 “수의(壽衣)는 호주머니가 없다”라는 의미다. 역시 속담 “Everyone has a skeleton to his closet”의 뜻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지하실에 해골을 두고 있다”가 아니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Everybody has a body in his basement.”와 같은 의미다. ‘복역하다’ 또는 ‘형을 살다’라는 뜻의 ‘do (one's) bird’는 ‘새를 친구로 삼다’로 오역되기도 한다.
지역이나 나라 이름, 국가기구 등 고유명사의 오역은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Satan's Condom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악마의 콘돔’이지만 이는 뉴욕시의 별칭이다. Big Apple은 ‘큰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뉴욕시의 별칭이다.(이밖에 뉴욕시의 별칭으로는 고담시(Gotham City), 소돔(Sodom), 고모라(Gomorrah) 등이 있다. 고담시는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1783-1859)이 당시의 풍자적인 정기간행물 ‘Salmagundi’ 1807년 11월 11일자에서 뉴욕시를 범죄와 부패, 탐욕의 도시라며 ‘Gotham’이라고 지칭한데서 연유한다.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부패와 타락, 범죄의 가상 도시도 고담시다. Gotham은 영국 Nottinghamshire의 한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미국은 주(州)와 도시에 나름대로의 별칭(nickname)이 있다. 예컨대 뉴욕 주는 ‘Empire State’, 뉴저지 주는 ‘Garden State’, 플로리다 주는 ‘Sunshine State’ 로 부른다.)
Big Board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리킨다. Pearl of the Adriatic은 ‘아드리해의 진주’가 아니라 ‘드보르 브니크 항(港)’이며, Low Countries는 ‘저지대 국가’가 아니라 ‘베네룩스 3국’을 지칭한다. 미국 의회의 ‘세입위원회’(참고로 미국 의회의 세출위원회는 Appropriations Committee라고 한다)인 Ways and Means Committee는 ‘수단과 방법위원회’로, ‘백악관 경호실’을 뜻하는 Secret Service는 ‘비밀서비스’로, ‘런던 경찰청’을 뜻하는 Scotland Yard는 ‘스코틀랜드 정원’으로 오역되고 있다. Show Me State는 미주리(Missouri)주의 별칭인데도 ‘나에게 州를 보여 다오’로 잘못 번역되고 있으며, 미국의 ‘州방위군’인 National Guard는 ‘국가방위군’으로 오역돼있다. 미 국무부를 뜻하는 Foggy Bottom도 ‘안개낀 늪지대’(영국 총리관저는 No 10 Downing Street(다우닝街 10번지), 영국 외무장관 공관은 Chevening House, 프랑스 외무부는 케르도세(Quai d'Orsay)로 불린다)로, 프랑스 총리관저를 가리키는 Hotel Matignon은 ‘마티뇽호텔’로 오역돼 있다. 캐나다의 미국접경에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 ‘원 타우선드 아일랜드’(One Thousand Island)는 국내 관광책자에 ‘1천개의 섬’으로 번역, 소개됐다.
외국에서의 오역사례도 배꼽을 쥐게한다. 예를 들면 문학작품의 경우 미국 매서추세스 주의 한 기숙고등학교(boarding highschool)학생들에 관한 이야기인 커티스 시튼펠드(Curtis Sittenfeld)의 소설 ‘Prep’(예비학교)은 브라질에서는 섹스 직전의 애무행위를 뜻하는 ‘전희’(前戱, foreplay)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다. 2005년 뉴욕 타임스의 ‘톱 파이브 소설’(top five fiction)에 선정된 이 소설은 한국에서 ‘사립학교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번역돼 있다. Prep이란 대학진학준비를 위한 ‘preparatory school’을 말한다.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Jerome David Salinger, 1919-2010)의 소설 ‘The Catcher in the Rye’(호밀밭의 파수꾼)는 러시아에서는 ‘Above the Precipice in the Rye’(호밀 밭의 벼랑 위)란 제목으로 출간됐다. 소설의 주인공인 16세의 홀든 콜필드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뿐인데 이는 넓은 호밀밭에서 아이들이 뛰다가 옆 벼랑으로 떨어지려 하면 얼른 잡아주는 일이라고 말한 데서 착상한 제목이 아닌가 보인다.
제임스 핀 가너(James Finn Garner)가 그의 베스트셀러 ‘Politically Correct Bedtime Stories’(정치적으로 올바른 동화책)를 서문에서 그의 아내 리스(Lies, 발음은 다르지만 거짓말을 뜻하는 영어 ‘lie’의 복수형)에게 바친다고 했다. 리스라는 이름은 네덜란드 말로 엘리자베스(Elizabeth)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책의 노르웨이 판에서는 이 책을 ‘거짓말들’(Untruths)에게 바친다고 돼 있다. ‘Lies’를 ‘거짓말들’로 해석하는 바람에 ‘Untruths’(거짓말들)에게 바친다고 번역된 것이다. (서옥식: ‘오역의 제국’(도서출판 도리, 2013) 저자)